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K리그2의 FC안양이 지난 11월2일 리그 1경기를 남기고 우승을 확정지었다. 2019~2022시즌 세 차례 모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지만 번번이 1부 승격의 문턱에서 주저 앉으며 아쉬움을 달래왔던 터라, 안양 지역 시민들은 이번 승격에 더욱 감회가 새로울 테다. 특히 오는 3월부터 1부 무대를 누비게 될 FC안양과 FC서울이 서로 맞붙게 될 구도를 두고 벌써부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바로 두 팀에 얽힌 흥미로운 역사 때문이다.
사실 FC안양은 2004년 안양LG치타스(현 FC서울)가 연고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팀을 잃은 팬들이 2013년 새롭게 창단한 클럽이다. 그렇기에 팀이 출범한 지 11년 만에 이룬 이번 승격을 더없이 소중한 성과로 여기는 이들이 있다. 바로 안양LG치타스 시절 과격하고 열정 가득한 응원으로 이름을 날린 서포터즈 ‘RED’다. 안양에 터를 잡고 살던 청년들은 언제나 늘 그 자리에 있었다.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Anyang Supporters Union(A.S.U.) RED는 1997년 4월 결성됐다. 이들은 한국 프로 축구에 새로운 응원 문화를 도입한 장본인들이다. 1998년 K리그 서포터들 가운데 처음으로 홍염(조난용 연막탄)을 도입했다. 현재로선 홍염을 안전 문제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시절 그 때는 경기장을 붉은 빛으로 물들이던 RED의 강성 서포터들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치타스가 서울로 연고지를 옮겨 ‘FC서울’이 되고난 뒤,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그들이 진정한 시민구단 ‘FC안양’을 다시 창단하는 과정까지 끈질기게 담아냈다. 단순한 축구 클럽의 변천사가 아니다. 인생을 바친 이들의 시간과 공간을 체험해볼 기회인 셈이다. 얼핏 보면 영화의 표면에 축구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 표층을 걷어내면, 안양이라는 지역의 역사와 그에 얽힌 추억들로 형성된 존재들의 삶이 어른거린다. 그렇기에 이 영화는 단순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다. 청춘의 기록이고, 도시에 깃든 숨결이고, 삶을 향한 열정이다. 소재를 축구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사람들에 대한 또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 셈이다. 그들의 희로애락과 삶을 지탱하고 또 연결하는 요소들 말이다.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의 도입부에 선명하게 흰 글씨로 각인되는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안양’을 떠올려 본다. 옛날 옛적 그 시절 안양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을까. 도입부 감독의 고백이 끝나면, 뒤이어 발언하는 이들은 안양 사람들 아니 한때는 과격하게 홍염을 터뜨리던 치타스의 서포터즈들이다. 감독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지만 억지로 하나의 주제를 위해 규합하는 시도는 하지 않았다. 이들 각자는 저마다 축구와 젊음 그리고 도시에 얽힌 나만의 기억을 소환하고, 감독은 그저 듣기만 한다. 이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주변의 시선, 같이 응원 문화를 선도했던 서포터들, 이들과 함께 경기장을 누볐던 선수들, 그리고 관계된 수많은 이들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았다.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한국 사회의 변천사에 뿌리내린 구조적인 모순도 함께 머금고 있다. 언제나 한국의 중심이었던 서울 곁에 있던 위성도시 안양은 더 큰 도시에 집중되는 인프라 속 밀려나는 사각지대였고,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에 녹아든 사연은 이런 구조를 자연스레 환기하고 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이 작품이 이를 통해 사회 문제를 제기하거나 혹은 구조상의 한계를 겨냥하고자 제작된 작품이 아니라는 것. 영화를 만든 이들은 원대한 야망을 달성하기 위해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는 말이다. 단지 궁금했을 뿐이다. 내가 자란 안양에 깃든 사연을 알아보고 싶고, 안양에 남은 이들이 왜 이런 선택을 내려야만 했는지 지그시 들여다보고 싶었던 게 아닐까. 결국 나를 둘러싼 삶의 조각들을 따라가기 위한 소박한 프로젝트처럼 느껴진다. 도입부에서도 나바루 감독은 스스로 고백하지 않았나. 1987년 세 살배기 때부터 안양에 살아오면서 왜 이 도시가 도통 재미 없는지, 어째서 특별한 점이 없는지 의문이 생겨 카메라를 들었다고 말이다.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그렇다면 이 다큐멘터리를 마주하는 관객들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영화의 종착지가 하나로 정해진 경로 상에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다양한 파편들이 어우러진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은 그렇게 관객들 각자의 경험과 연동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영화가 무언가를 공유한다는 감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선호빈·나바루 감독의 손을 떠난 ‘수카바티: 극락축구단’이 관객들과 동화되는 순간을 음미하는 일은 그 자체로 즐겁고 풍부한 감칠맛을 만들어낸다. 이건 바로 ‘연결의 감각’이다. 이 연결은 단순한 공동체 정신을 말하는 게 아니다. 바로 집단에서 출발해 각자의 개인으로 확장되는 것. 그렇기에 영화는 스크린에만 머물지 않는다. 객석에 흡수되고, 또 관객은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만의 추억을 곱씹어보고 소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영화 '수카바티: 극락축구단' 스틸컷. 영화사 진진 제공 ![‘무파사: 라이온 킹’ 전작 흥행 잇는다,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 [공식]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609/2024/12/19/202412190939211110_1_202412190947119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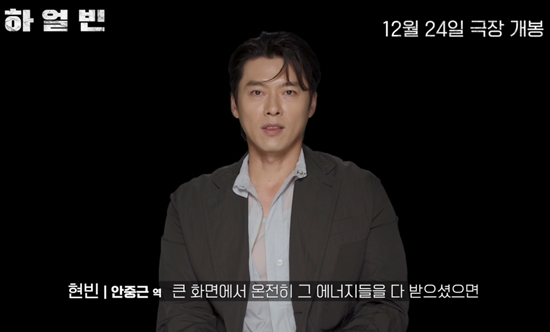
![[포토] 이동욱, '부드러운 눈빛'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4/12/18/0005071947_001_202412182044105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