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가 더 현실 같을 때가 있고, 현실이 더 영화 같을 때도 있다. 만약 이 ‘때’가 동일하다면 한 문장 안에 묶인 이 두 명제는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이 그렇다. 모순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참으로 역설적인 때다. 2023년 최고 흥행 영화는 <서울의 봄>이었다. 그리고 2024년은 <파묘>가 될 게 확실하다. 둘 다 과거에 태어난 망령이 오늘을 배회하게 한다. 이제는 옛것이 되었다고 생각했던 군사반란 이야기에 이렇게 많은 이들이 호응을 할지 몰랐다. 또 우리나라에서 오컬트 장르가 이토록 많은 대중을 불러 모은 적도 처음이다. 하나는 역사를 재구성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역사에 바탕을 둔 허구임에도, 지금 현실 속의 무언가를 강하게 지목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테다.
감이다. 여기서 ‘이미 보았던 것 같은 감각’을 유발하는 건 지금 현실이기도 하고 영화 속 과거이기도 하다. 과거와 현재가, 상상과 실제가, 영화와 현실이 이토록 기막히게 상호 기시감을 유발한다는 것도 참 놀랍다. 우리는 전두광을 보며 윤석열을 떠올렸고, 다시 윤석열에게서 전두환이 겹쳐 보이는 환각을 느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온갖 패악들은 파묘한 곳에서 튀어나온 ‘험한 것’들이 생각나게 했다. 그러나 이것은 환각도, 상상 속의 헛것도 아니었다. 윤석열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뒤이은 특수부대의 국회 난입 장면만큼이나, 망령에게 몸을 내준 이 나라의 현실을 극적으로 보여줄 영화는 당분간 없을 것 같다.
현실은 이야기를 만들고, 다시 이야기는 현실을 만든다. 어떻게든 권력을 되찾고 싶었던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라는 망령을 불러내었고, 이 글을 쓰는 이 시점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몸과 갑옷을 입은 그 망령을 보호하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러나 1979년에 패배했던 우리 헌정과 시민은 2024년에는 그 패배를 반복하지 않으려 한다. 윤석열은 주술을 헌법처럼 신봉했던 것 같고, 법을 주술처럼 써서 험한 것들을 부렸다. 그러나 (소수의 환혼 기술자들을 제외하고는) 입법부도 이를 에워싼 시민도 주술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로써 이 망령을 퇴치하려 한다. 이 글이 독자들에게 읽힐 시점엔 망령은 갈기갈기 찢기고 그것이 입었던 몸들은 법의 준엄한 구속력 안에 가두어져 있기만을 바랄 뿐이다.
이들 영화의 성공을 가능하게 한 시대착오적 미치광이와 ‘망령의 힘’ 자체는 우리에게 불행이지만, 그들의 대중적 흥행이 이 시대를 과거로 되돌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예방접종 효과를 가져왔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 문학도 있다.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가 되살린 영혼은 우리의 몸을 입고 국회 앞에 모인 소년들이 되었다. 노벨문학상 수상 강연을 통해 한강 작가가 말한 바처럼 “과거가 현재를 돕고 있다고, 죽은 자들이 산 자를 구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들”이다. 단절해야 할 과거와 연결되어야 할 과거, 우리를 죽이는 망령과 우리를 살리는 영혼을 구별하게 해준 영화와 문학에게, 그리고 그걸 보고, 읽고, 감응해준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무파사: 라이온 킹’ 전작 흥행 잇는다,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 [공식]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609/2024/12/19/202412190939211110_1_202412190947119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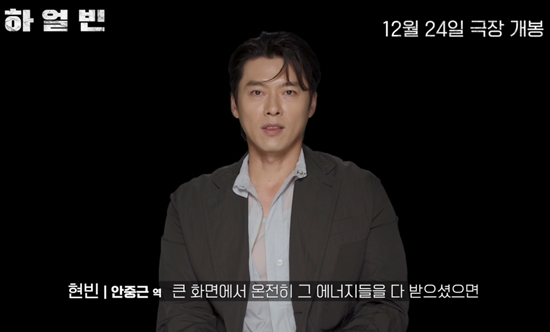
![[포토] 이동욱, '부드러운 눈빛'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4/12/18/0005071947_001_2024121820441057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