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의 씨네만세 906] 서울독립영화제 <블랙박스>단순하고 선명한 작품이다. 달리는 택시 안 기사와 승객의 신뢰란 딱 사회가 부여한 만큼. 공권력이 작동을 않는 외딴 지역에서, 또 수없이 보도된 범죄와 비슷한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 신뢰는 거품처럼 꺼져 스러질 수 있는 일이다.
승객이 기사를 불신하는 상황의 공포로부터 출발해 장르물의 전형적 쾌감으로 이어지는 전개까지가 흥미로운 작품 <블랙박스>를 보았다. 촬영도 독특한 방식, 차 내부에 달린 블랙박스를 그대로 활용해 장르물을 찍어낸 연출이 과거 <클로버필드> 시리즈를 보는 듯 색다르게 다가온다.
이 같은 촬영법을 흔히 파운드 푸티지(found footage), 즉 발견된 촬영물이라 하는 건, 참혹한 사건 뒤 회수된 촬영물로부터 분석된 끔찍하고 기괴한 사건이 영화를 그저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넘어 사실적인 무엇으로 여기도록 하는 탓이다. 파운드 푸티지는 어느덧 영화촬영의 효과적 수단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다.
 ▲ 블랙박스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좀비물 떠올리게 하는 안정된 단편서울독립영화제 단편 쇼케이스로 소개된 <블랙박스>는 파운드 푸티지 기법을 활용한 단편 장르영화다. 좀비를 연상케 하는 괴생명체가 등장한다는 점에선 이미 뒤처진 흔한 작품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이지만, 기사와 승객이란 단 두 배우의 조화에 더해 파운드 푸티지 촬영까지가 작품에 나름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영화는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밤길을 달리는 택시 내부를 비춘다. 처음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던 택시가 어느 순간 색다른 긴장에 사로잡힌다. 기사는 네비게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당혹스럽다 하고, 승객은 그가 저를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항으로 가는 길을 영 잘못 든 것인지 다니는 차 한 대가 없고 가로등 또한 없는 으슥한 외딴 길이니 그럴 듯도 하다.
생각 없는 승객이 대놓고 기사를 의심하는 듯한 발언까지 하고 보니 분위기는 영 삭막해 되돌릴 길 없다. 더구나 어쩐 일인지 차가 아무것도 없는 길 위에서 무언가를 친 듯한 충격까지 전해진다. 괴이한 것은 살펴 보아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로부터 영화는 한 편 스릴러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 블랙박스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택시 내부 블랙박스로 한 편 영화를영화는 괴생명체가 나타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괴생명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좀비와 얼마 다르지 않아 기존의 흔하고 낡은 문법을 빌려다가 답습한단 인상을 어찌할 수 없다. 단편다운 참신함을 기대했던 이라면 실망할 밖에 없는 구성이 얼마쯤 이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기사와 승객의 신경전, 또 알 수 없는 상황이 주는 긴장은 영화에 분명하고 선명한 동력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칠흑같이 어둡단 말이 꼭 잘 어울리는 장소가 마치 하나의 인물처럼 극에 강렬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어두운 장소와 알 수 없는 분위기, 무너져 내린 신뢰 위에 괴생명체가 주는 공포를 끼얹는 것, 그것이 감독 정경렬이 12분 짜리 단편에서 꺼내든 승부수라 하겠다.
영화가 상영되고 난 뒤 이어진 감독과의 대화에서도 <블랙박스>에 대한 관심이 적잖았다. 가장 주효한 장소를 그는 우연히 만났다고 하였는데, 어느 날 차를 몰고 길을 가던 중 이 어둡고 외딴 장소를 지나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대로 이 장소에서 찍을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해야겠다고 결심하였고, 그 결심이 오늘의 <블랙박스>로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 블랙박스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신뢰가 무너진 자리, 공포가 선다실제로 장소가 너무나 어두웠던 나머지 스태프들이며 배우들끼리도 서로를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촬영이 이뤄졌고, 어찌하다 그런 것인지 본래 촬영하던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 얼마간 실제 블랙박스 영상으로 작품을 만드는 소동도 이어졌단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로 파운드 푸티지의 장점을 잘 살린 결과로 이어졌고, 또 그 어두움이 다른 문제를 얼마쯤 가려주었으므로 그대로 <블랙박스>가 영화제에 출품할 만한 작품으로 완성되었다는 이야기다.
감독은 이 영화에 대해 붙인 글에서 '개개인이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현대사회의 공포를 녹여 내고 싶었다'는 의도를 전했다. 서로를 불신하고 경계하는 공포와 괴생명체가 등장하는 장르물을 엮어내며 장르적 재미와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함께 섞고자 한다는 의도가 얼마쯤 성공적으로 귀결된 듯하다.
무엇보다 작품의 능숙한 연출이 이후 보다 길고 복합적인 공포며 스릴러 장르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점이 인상적이다. 기존의 문법을 답습한단 점에서 새로움이 옅다고도 볼 수 있으나 비교적 그를 잘 수행해냈다는 점은 기록할 만하다.
 ▲ 서울독립영화제
▲ 서울독립영화제 포스터ⓒ 서울독립영화제
새로운 것 없다지만 새로워져야한편으로 택시에 탄 승객에게 있어 기사가 주는 공포가 괴생명체에 대한 것으로 무리 없이 전환된단 점도 의미가 있다. 신뢰가 무너진 환경에서 기사와 괴생명체가 모두 저를 해할 수 있는 위협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감독은 10여 분의 러닝타임에 맞는 단순한 캐릭터를 두 인물에게 입혀 관객의 간접적 경험을 투영하길 의도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그 형식과 구성에 있어서도 전형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품이 캐릭터로 새로움을 더할 수 있는 기회를 그저 흘려보내고 말았단 점에 있다. 괴생명체는 끝까지 미지의 괴물이고, 승객은 끝까지 예정된 피해자이며, 기사는 오해받는 제삼자에서 얼마 벗어나지 못한단 점에서 한계 또한 명확하다 할 것이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 없다지만 끊임없이 경계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창작자의 자질이며 책무이기도 하다. 언제나 변방에서 변혁이 시작되듯, 영화라는 작업 또한 기존의 안정된 기법이며 구성, 착상으로부터 새로움을 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연출하는 것에 있어서는 흠 잡을 구석이 얼마 없는 작품임에도, 그 이상을 바라게 되는 건 이것이 세상에 없던 무엇을 이루어내는 작가의 작품이길 기대하는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김성호 평론가의 브런치(https://brunch.co.kr/@goldstarsky)에도 함께 실립니다. '김성호의 씨네만세'를 검색하면 더 많은 글을 만날 수 있습니다.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블랙박스 스틸컷ⓒ 서울독립영화제 ▲ 서울독립영화제 포스터ⓒ 서울독립영화제
▲ 서울독립영화제 포스터ⓒ 서울독립영화제
![‘무파사: 라이온 킹’ 전작 흥행 잇는다, 개봉 첫날 외화 박스오피스 1위 [공식]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609/2024/12/19/202412190939211110_1_20241219094711986.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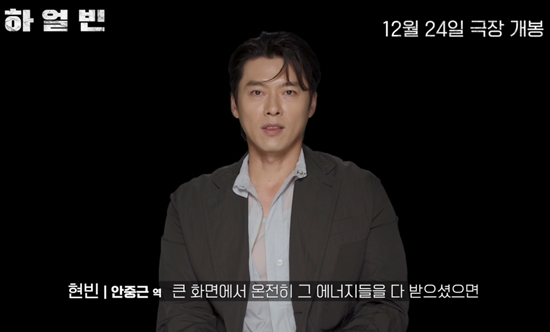
![[포토] 이동욱, '부드러운 눈빛'封面图](https://imgnews.pstatic.net/image/015/2024/12/18/0005071947_001_20241218204410577.jpg)
